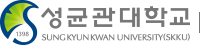<명구>
惟以至公無私, 立於光天和日 (至公無私)
惟(유): 오직 私(사): 자기, 개인, 홀로 光(광): 빛나다, 광택
<해석>
오직 지극히 공평하여 사사로움이 없는 마음으로, 당당히 빛나는 하늘 화창한 태양 아래 서야 하는 것이다.
<내용>
최한기가 사람의 그릇을 고험(考驗)하는 것은 국정이 다스려지느냐 다스려지지 못하느냐를 신중히 평가하는 것이다. 한 개인이 잘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. 이 뜻을 들어 평가해서 등용하면, 권세도 두려울 것이 없고 원망과 허물도 근심할 것이 없다. 오직 지극히 공평하여 사사로움이 없이 당당히 빛나는 하늘 화창한 태양 아래 서는 것이다[人器考驗, 乃國政治不治之考驗. 非爲一人榮枯之考驗. 擧斯義而考驗, 則權勢不足畏, 怨尤不足恤. 惟以至公無私, 立於光天和日].” 라고 하였다.
한 나라에서 주요한 자리에 인재를 등용하는 일은 국가의 존립과도 관계한다. 고대 나라가 망한 경우를 보면 몇몇은 왕이 경국지색에 눈이 멀어 충신을 멀리하고 간신을 가까이 한 예도 있지만, 관리 등용을 잘못하여 나라가 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. 그래서 선각자들이 인재 등용의 중요함을 늘 부르짖었다.
최한기는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릇을 지닌 자가 그 자리를 맡게 되면, 윗사람의 권세 때문에 소신을 굽히지 않고 백성들의 원망도 두렵게 여기지 않는다고 했다. 옛 부터 사람의 역량을 그릇에 비유해 왔는데, 자기 그릇의 크기는 결국 얼마나 공평하며 사사로움이 없는가 에 달려있다. 또 그 사람이 평소 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도 역시 중요하다. 언행이 일치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사사로움이 없고 공평하여야 가능하기 때문이다, 자기 그릇이 큰 자는 공평하기 때문에 국정을 행할 때 꺼리거나 두려워하여 윗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다. 그렇지 않은 자는 늘 윗사람의 의중을 살펴 국정을 행하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게 된다.
대만 총통부 건물 안 총통이 출퇴근 하는 길목에 ‘정치를 잘못하면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다. 만약 너희들이 정치를 잘못한다면 우리 국민은 지켜보기만 하지 않겠다.’ 라고 단호한 어투의 문구로 백성들의 바람이 적혀있었다. 이 글이 ‘정치인은 오직 지극히 공평하여 사사로움이 없는 마음으로 당당히 빛나는 하늘 화창한 태양 아래 서라!’ 라고 말하고 있는 듯하였다.
자기 자신이 그릇이 안 되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. 자리에 연연하여 물러나지 못하는 것 또한 사사로움 때문이다. 정치인은 반드시 공평무사[至公無私]를 실천해야 한다. 그래야 당당하게 빛나는 하늘 화창한 태양 아래 설 수 있다. 하지만 공평무사는 쉬운 것이 아니다. 한 사람이 학문을 열심히 하여 전문 지식을 지녔다 하더라도 별도의 도덕적 수양을 해야 한다. 정치인이라면 등용되기 전에 도덕적으로 성숙한가를 고험해야 한다.
<출전> 『인정(人政)』 권15 「선인문(選人門)」 2
집필자 : 권오향/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